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H-정리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고전 통계역학에서, 1872년 루트비히 볼츠만이 도입한 H-정리(영어: H-theorem)는 거의 이상기체 분자에서 H(아래 정의됨)의 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설명한다.[1] 이 양 H는 열역학적 엔트로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H-정리는 근본적으로 비가역과정에 대한 진술인 열역학 제2법칙을 가역적인 미시적 역학으로부터 도출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통계역학의 힘을 일찍이 보여주었다. 낮은 엔트로피 초기 조건을 가정하긴 하지만, 열역학 제2법칙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3][4][5]
H-정리는 볼츠만이 도출한 운동 방정식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후 볼츠만 운송 방정식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H-정리는 실제 함의에 대해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6]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엔트로피란 무엇인가? 볼츠만의 양 H는 열역학적 엔트로피에 어떤 의미에서 해당하는가?
- 볼츠만 방정식의 배경이 되는 가정(분자 무질서 가정 등)이 너무 강력한가? 이 가정들은 언제 위반되는가?
Remove ads
명칭과 발음
볼츠만은 그의 원래 출판물에서 통계 함수에 대해 기호 E(엔트로피의 E)를 사용했다.[1] 수년 후, 이 정리의 비평가 중 한 명인 새뮤얼 혹슬리 버버리는[7] 함수를 기호 H로 표기했고,[8] 이 표기법은 볼츠만이 자신의 "H-정리"를 언급할 때 채택되었다.[9] 이 표기법은 정리의 명칭에 대한 약간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 진술은 일반적으로 "에이치 정리"로 불리지만, 때로는 대문자 그리스 문자 Eta (Η)가 대문자 라틴 음소문자 h (H)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Eta 정리"라고 불린다.[10] 기호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정리 당시의 서면 자료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불분명하다.[10][11] 타이포그래피 연구와 J. W. 기브스의 연구는[12] H를 에타로 해석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13]
Remove ads
볼츠만의 H의 정의와 의미
요약
관점
H 값은 시간 t에서 분자의 에너지 분포 함수인 f(E, t) dE로부터 결정된다. f(E, t) dE 값은 E와 E + dE 사이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이다. H 자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고립된 이상기체(총 에너지와 총 입자 수가 고정된)의 경우, H 함수는 입자들이 맥스웰-볼츠만 분포를 가질 때 최소가 된다. 이상기체 분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다면(예를 들어, 모두 동일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면), H 값은 더 높아질 것이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볼츠만의 H-정리는 분자 간의 충돌이 허용될 때, 이러한 분포들이 불안정하며 비가역적으로 H의 최소값(맥스웰-볼츠만 분포)을 향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기법에 대한 참고: 볼츠만은 원래 양 H에 문자 E를 사용했다. 볼츠만 이후의 문헌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문자 H를 사용한다. 볼츠만은 또한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기 위해 기호 x를 사용했다.)
Remove ads
볼츠만의 H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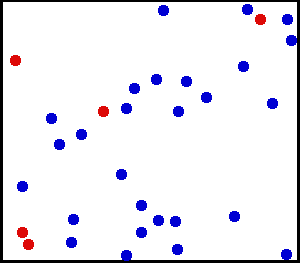
볼츠만은 두 입자 사이의 충돌 중에 일어나는 일을 고찰했다. 두 입자(예: 단단한 구) 사이의 탄성 충돌에서 입자 사이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초기 조건(충돌 각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역학의 기본 사실이다.
볼츠만은 Stosszahlansatz(분자 무질서 가정)로 알려진 핵심 가정을 했다. 즉, 기체에서 모든 충돌 사건 동안 충돌에 참여하는 두 입자는 1)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된 운동 에너지를 가지며, 2) 독립적인 속도 방향을 가지며, 3) 독립적인 시작 지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과 에너지 전달 역학을 고려할 때, 충돌 후 입자의 에너지는 계산될 수 있는 특정 새로운 무작위 분포를 따르게 될 것이다.
기체 내 모든 분자들 사이의 반복적이고 비상관적인 충돌을 고려하여 볼츠만은 자신의 운동 방정식(볼츠만 운송 방정식)을 구성했다. 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는 지속적인 충돌 과정이 H의 양을 감소시켜 최소값에 도달할 때까지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다.
영향
볼츠만의 H-정리는 원래 주장되었던 것처럼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절대적인 증명은 아니었지만(아래 비판 참조), H-정리는 볼츠만이 19세기 말에 열역학의 본질에 대한 점점 더 확률론적인 논증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열역학에 대한 확률론적 관점은 1902년 조사이어 윌러드 기브스의 완전한 일반 시스템(기체뿐만 아니라)을 위한 통계역학과 일반화된 통계 앙상블의 도입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운동 방정식, 특히 볼츠만의 분자 무질서 가정은 반도체 내 전자의 운동과 같은 입자 운동을 모델링하는 데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볼츠만 운송 방정식 계열 전체에 영감을 주었다. 많은 경우 분자 무질서 가정은 매우 정확하며, 입자들 간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은 계산을 훨씬 간단하게 만든다.
열역학 평형화 과정은 H-정리 또는 완화 정리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14]
Remove ads
비판과 예외
요약
관점
아래에 설명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유로 H-정리는 적어도 원래의 1871년 형태에서는 완전히 엄밀하지 못하다. 볼츠만은 결국 인정했듯이 H-정리에서 시간의 화살은 사실 순전히 역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기 조건에 대한 가정의 결과이다.[15]
로슈미트의 역설
볼츠만이 H-정리를 발표한 직후 요한 요제프 로슈미트는 시간 대칭적인 동역학과 시간 대칭적인 형식론으로부터 비가역 과정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만약 H가 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면, H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짝을 이루는 역전된 상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로슈미트의 역설). 이에 대한 설명은 볼츠만 방정식이 "분자 무질서"라는 가정, 즉 입자들이 독립적이고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운동 모델에서 파생되거나 적어도 그것과 일치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정이 미묘한 의미에서 시간 역전 대칭을 깨뜨리고, 따라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입자들이 충돌하도록 허용되면, 그들의 속도 방향과 위치는 실제로 상관 관계를 갖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상관 관계는 극도로 복잡한 방식으로 인코딩된다). 이는 독립성(지속적인) 가정이 근본적인 입자 모델과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볼츠만은 로슈미트의 반박에 이러한 상태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종류의 상태가 너무 희귀하고 특이해서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볼츠만은 이 "희귀성" 개념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 1877년의 볼츠만 엔트로피 공식을 도출했다.
스핀 에코
로슈미트의 역설을 보여주는 현대적인 반례(볼츠만의 원래 기체 관련 H-정리가 아닌, 밀접하게 관련된 유사체)는 스핀 에코 현상이다.[16] 스핀 에코 효과에서는 스핀 상호작용 시스템에서 시간 역전을 물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스핀 시스템에 대한 볼츠만의 H의 유사체는 시스템 내 스핀 상태의 분포를 통해 정의될 수 있다. 실험에서 스핀 시스템은 처음에는 비평형 상태(높은 H)로 교란되며, H-정리가 예측하는 대로 H의 양은 곧 평형 값으로 감소한다. 어느 시점에서, 신중하게 구성된 전자기 펄스가 모든 스핀의 움직임을 역전시키기 위해 가해진다. 그러면 스핀들은 펄스 이전의 시간 진화를 되돌리고, 얼마 후 H는 실제로 평형에서 벗어나 증가한다(진화가 완전히 풀리면 H는 다시 최소값으로 감소한다). 어떤 의미에서 로슈미트가 언급한 시간 역전 상태가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푸앵카레 재귀 정리
1896년 에른스트 체르멜로는 H-정리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은 시스템의 H가 어떤 시점에서든 최소값이 아니라면 푸앵카레 재귀 정리에 의해 비최소 H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비록 극도로 긴 시간 후이기는 하지만). 볼츠만은 H의 이러한 반복적인 상승이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긴 시간 동안 시스템이 이러한 반복적인 상태 중 하나에 머무는 시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열역학 제2법칙은 고립계의 엔트로피가 항상 최대 평형 값까지 증가한다고 명시한다. 이것은 입자 수가 무한한 열역학적 극한에서만 엄밀하게 참이다. 유한한 수의 입자의 경우, 항상 엔트로피 요동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립계의 고정된 부피에서 최대 엔트로피는 입자의 절반이 부피의 한 절반에 있고, 나머지 절반이 다른 절반에 있을 때 얻어지지만, 때때로 한쪽 면에 다른 쪽보다 몇 개의 입자가 일시적으로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엔트로피의 매우 작은 감소를 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엔트로피 요동은 오래 기다릴수록 그 시간 동안 더 큰 엔트로피 요동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주어진 엔트로피 요동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최소 가능한 값으로의 요동조차도 항상 유한하다. 예를 들어, 모든 입자가 용기의 한 절반에 있는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기체는 빠르게 평형 엔트로피 값을 얻을 것이지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이와 동일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이다. 실제 시스템, 예를 들어 실온 및 대기압에서 1리터 용기의 기체의 경우, 이 시간은 우주의 나이의 몇 배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시간이며, 실용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다.
작은 시스템에서 H의 요동
H는 보존되지 않는 기계적으로 정의된 변수이므로 다른 모든 변수(압력 등)와 마찬가지로 열적 요동을 보인다. 이는 H가 최소값에서 자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으로 이것은 H 정리의 예외가 아닌데, H 정리는 매우 많은 수의 입자를 가진 기체에만 적용되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동은 시스템이 작고 관찰되는 시간 간격이 엄청나게 크지 않을 때만 감지할 수 있다.
H가 볼츠만이 의도한 대로 엔트로피로 해석된다면, 이것은 요동정리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Remove ads
정보 이론과의 연결
H는 섀넌의 정보 엔트로피의 선구자이다. 클로드 섀넌은 그의 정보 엔트로피 측정치를 H-정리 후에 H로 명명했다.[17] 섀넌의 정보 엔트로피에 대한 문서는 설명을 포함한다. 정보 엔트로피 또는 정보 불확실성(마이너스 부호 포함)으로 알려진 양 H의 이산 대응물에 대한 설명. 이산 정보 엔트로피를 연속 정보 엔트로피로 확장함으로써, 또한 미분 엔트로피라고 불리는, 위에 있는 섹션 볼츠만의 H의 정의와 의미의 방정식에서 표현을 얻게 되며, 따라서 H의 의미에 대한 더 나은 느낌을 얻게 된다.
정보와 엔트로피 사이의 H-정리 연결은 최근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고 불리는 논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톨먼의 H-정리
요약
관점
리처드 C. 톨먼의 1938년 저서 "통계역학의 원리"는 볼츠만의 H-정리 연구와 기브스의 일반화된 고전 통계역학에서의 확장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 또 다른 장은 H-정리의 양자역학적 버전에 할애되어 있다.
고전 역학적
우리는 개의 입자 집합에 대한 일반화된 정준좌표를 qi와 pi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위상 공간의 상태에 대한 입자의 확률 밀도를 반환하는 함수 를 고려한다. 이것이 위상 공간의 작은 영역인 과 곱해져 해당 영역의 (평균) 예상 입자 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주목하라.
톨먼은 볼츠만의 원래 H 정리에서 H 양의 정의에 대한 다음 방정식을 제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위상 공간이 분할되는 영역들을 로 인덱싱하여 합산한다. 그리고 무한소 위상 공간 부피 의 극한에서 합을 적분으로 쓸 수 있다.
H는 또한 각 셀에 존재하는 분자 수의 관점에서 쓸 수 있다.
양 H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P는 지정된 작은 바른틀 앙상블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시스템을 찾을 확률이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G는 고전 상태의 수이다.
양 H는 속도 공간에 대한 적분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1)
여기서 P(v)는 확률 분포이다.
볼츠만 방정식을 사용하여 H는 오직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N개의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입자 시스템에 대해 H는 열역학적 엔트로피 S와 다음과 같이 관련된다.[23]
따라서 H-정리에 따르면 S는 오직 증가할 수 있다.
양자 역학적
양자통계역학(고전 통계역학의 양자 버전)에서 H 함수는 다음 함수이다.[24]
여기서 합계는 시스템의 모든 가능한 구별되는 상태에 대해 실행되며, pi는 시스템이 i번째 상태에서 발견될 확률이다.
이는 기브스 엔트로피 공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예를 들어 Waldram (1985), p. 39를 따라) H 대신 S를 사용하여 진행할 것이다.
먼저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Σ dpi/dt = 0이라는 사실을 사용하여, Σ pi = 1이므로 두 번째 항은 사라진다. 나중에 이것을 두 개의 합으로 나누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페르미 황금률은 상태 α에서 β로, 그리고 상태 β에서 α로의 양자 도약의 평균 속도에 대한 마스터 방정식을 제공한다. (물론 페르미 황금률 자체도 특정 근사를 사용하며, 이 규칙의 도입이 비가역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볼츠만의 Stosszahlansatz의 양자 버전이다.) 고립계의 경우 도약은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이다.
여기서 역학의 가역성은 동일한 전이 상수 ναβ가 두 표현 모두에 나타나도록 보장한다.
따라서
합계의 두 차이 항은 항상 동일한 부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므로 전체적으로 두 음수 부호는 상쇄된다.
그러므로
고립계의 경우.
동일한 수학은 때때로 상대 엔트로피가 세부 균형의 마르코프 과정의 리아푸노프 함수임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며, 다른 화학적 맥락에서도 사용된다.
Remove ads
기브스의 H-정리
요약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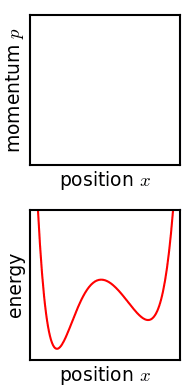
조사이어 윌러드 기브스는 미시적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또 다른 방식을 설명했다.[25] 후대 저자들은 이를 볼츠만의 결론과 유사하여 "기브스의 H-정리"라고 불렀다.[26] 기브스 자신은 이를 H-정리라고 부른 적이 없으며, 실제로 그의 엔트로피 정의와 증가 메커니즘은 볼츠만의 것과 매우 다르다. 이 섹션은 역사적 완전성을 위해 포함되었다.
기브스의 엔트로피 생성 정리의 배경은 통계 앙상블 통계역학이며, 엔트로피 양은 시스템 전체 상태에 대한 확률 분포로 정의된 기브스 엔트로피(정보 엔트로피)이다. 이는 시스템의 특정 상태 내에서 개별 분자의 상태 분포로 정의된 볼츠만의 H와 대조적이다.
기브스는 처음에는 위상 공간의 작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앙상블의 움직임을 고려했다. 이는 시스템의 상태가 상당히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은 상태(낮은 기브스 엔트로피)를 의미한다. 이 앙상블의 시간 경과에 따른 진화는 리우빌 방정식에 따라 진행된다. 거의 모든 종류의 현실적인 시스템에서 리우빌 진화는 위상 공간을 "휘젓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비압축성 유체에서 염료가 섞이는 과정과 유사하다.[25] 시간이 지나면 앙상블은 위상 공간 전체에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하게 줄무늬 패턴을 이루고 있으며, 앙상블의 총 부피(및 기브스 엔트로피)는 보존된다. 리우빌 방정식은 시스템에 무작위 과정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기브스 엔트로피를 보존하는 것이 보장된다. 원칙적으로 원래 앙상블은 움직임을 역전시킴으로써 언제든지 복구될 수 있다.
이 정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휘저어진 앙상블의 미세 구조가 어떤 이유로든 아주 약간 흐려지면 기브스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앙상블은 평형 앙상블이 된다. 왜 이러한 흐려짐이 실제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안된 메커니즘이 있다. 예를 들어, 제안된 메커니즘 중 하나는 어떤 이유로 위상 공간이 거칠게 분할된다는 것이다(그림에 표시된 위상 공간 시뮬레이션의 픽셀화와 유사하다). 필요한 유한한 정밀도로 인해 앙상블은 유한한 시간 후에 "상당히 균일해진다". 또는 시스템이 환경과 미세하고 통제되지 않는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앙상블의 날카로운 일관성이 손실될 것이다. 에드윈 톰슨 제인스는 흐려짐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단순히 시스템 상태에 대한 지식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7] 어쨌든, 어떻게 발생하든, 흐려짐이 역전될 수 없다면 기브스 엔트로피 증가는 비가역적이다.
정확히 진화하는 엔트로피는 증가하지 않으며, 미세 엔트로피(fine-grained entropy)라고 알려져 있다. 흐려진 엔트로피는 거친 엔트로피(coarse-grained entropy)라고 알려져 있다. 레너드 서스킨드는 이러한 구분을 솜털 뭉치의 부피 개념에 비유한다.[28] 한편으로는 섬유 자체의 부피는 일정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공의 윤곽에 해당하는 더 큰 거시적인 부피가 있다.
기브스의 엔트로피 증가 메커니즘은 볼츠만의 H-정리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한다. 기브스 엔트로피는 요동하지도 않고 푸앵카레 재귀를 나타내지도 않으므로, 기브스 엔트로피의 증가는 일단 발생하면 열역학에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비가역적이다. 기브스 메커니즘은 그림에 표시된 단일 입자 시스템과 같이 자유도가 매우 적은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잘 적용된다. 앙상블이 흐려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한, 기브스의 접근 방식은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더 깔끔한 증명이다.[27]
불행히도 존 폰 노이만 등이 양자통계역학의 발전 초기부터 지적했듯이 이러한 종류의 논증은 양자역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9] 양자역학에서는 관련 힐베르트 공간의 유한한 차원 때문에 앙상블이 계속해서 더 미세한 혼합 과정을 지원할 수 없다. 고전적인 경우처럼 평형 앙상블(시간 평균 앙상블)에 점점 더 수렴하는 대신, 양자 시스템의 밀도 행렬은 끊임없이 진화를 보일 것이고, 심지어 재귀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Stosszahlansatz에 의존하지 않고 H-정리의 양자 버전을 개발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29]
Remove ads
같이 보기
내용주
각주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






















